[최재천*동물행동학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분야가 뭐냐?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교육에 대해선 한 말씀 다 하십니다. 다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부 없애라는 얘기까지 거침없이 하십니다. “내가 더 자라도 저 교육부 놈들 말이야. 맨날 헛짓하고 말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육에 관한 관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덕에 별로 좋지 않은 교육제도였지만, 우리 참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 창의적인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실체가 교육자로서 고민하다가 뜻밖의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토론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15년 동안 거의 모든 수업은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학도 토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대학에 부임한 첫 학기부터 토론 수업을 시작했는데, 단 한 번도 재미있게 토론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쓸쓸하게 제 삶을 정리합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걸 못할까?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하는 많은 분야에서 ‘K’ 자만 앞에 붙이면 거의 세계 최고잖아요. K-푸드, 한국 문화, K-뮤직, 그리고 한강 선생 덕분에 K-문학도 이제 세계 최곱니다.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정치’ 정치는 세계에서 아마 저 바닥일 겁니다. 조만간 우리 정치 앞에도 K를 붙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참 해도 해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 계신 분들 허구한 날 만나서 계속 싸움하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대개 여야 의원들이 되게 재밌게 얘기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관장을 3년 해봐서 아는데 점심시간에는 화기애애하게 온갖 의견들이. 근데 오후에 들어가면 또 싸우세요. 왜 이렇게 못할까?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제법 좋은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탑에 올라가면 거기서 유대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정말 싫었습니다. 나는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저 친구들은 교수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저 친구들을 상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 늘 주눅 들어서 살았는데, 그 유대인 친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저한테 제일 많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냐?” 저는 그 친구들한테 “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런 얘기 들을 줄은 정말 몰랐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탁월한 민족이 없을 겁니다. 개인 개인들은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인데,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 서로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우리가 배우면 훨씬 나은 나라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토론의 목적은 뭘까?
한때 유명했던 토론 프로그램 제목이 <끝장토론>입니다. 저건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토론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토론을 “Who is right?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론장의 모습을 보시면 결연하기 짝이 없잖아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려고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얘기만 막 계속하고, 기껏 남의 얘기 듣는 건 말꼬투리 잡으려고, 약점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100시간을 토론하면 뭐 합니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원래 토론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다듬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못할까요.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계기는 1998년에 하버드 대학 시절에 지도교수님, 윌슨 교수님이 학문 간에 넘나듦, 분야 간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컨실리언스>(consilience)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통섭’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서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 출시가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짜리 설명문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문 읽다가 정말 감탄했어요. 첫 문단은 이겁니다.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철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학문 간에 넘나든 분야 간의 소통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와인이 뭐냐? 와인은 우주와 인성의 조합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그걸 이름으로 컨실리언스.....’ 읽으면서 감탄했는데요.
두 번째 문단이 더 감격적이었습니다. 이름을 짓기로 했답니다. 네 명의 와이너리 오너들을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년의 와이너리 오너들이 같이 만든 건데, 그래서 넷이 몇 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각자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왔대요. 몇 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우리들 중의 하나가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적어서 넣었다. 개표했다. 만장일치였다.’ 뭐 이랬어요.
만장일치래 봤자 4표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4표 중의 3표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름, 몇 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던 그 이름. 그걸 기꺼이 접고 자기들 중의 한 친구가 만든 이름에 기꺼이 한 표를 던졌다는 거죠. 이게 토론하는 목적입니다. 내 것을 관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그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보다 훌륭하면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게 토론의 목적인 겁니다.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상하게 이걸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관찰하니까 이게 결국은 교육이더라고요. 서양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합니다. 선생님들은 뒤에서 지켜보고, 아이들끼리 “그러면 오늘 우리 이걸로 하기로 해요.” 이러면서 박수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초중등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에 오니까 대학의 교수들도 계속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제가 몇십 년을 토론 수업을 해도 한 번도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의 아주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사실은 하나인데요. 교과과정을 바꿔야 하는데 참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은 대학입시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뜻있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할겁니다. 하지만 보나 마나 학부모 전화 받겠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애들 입시 잘 준비 시켜라.”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가망이 없나? 그런데 제가 그동안 관찰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 속도가 참 탁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배우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빠른 속도로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조금만 훈련하면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기대하게 된 배경은 뭐냐? 우리가 내내 이걸 못했던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 시대의 우리 임금님들은 경연을 했다고 그러지요. 세종대왕님은 하루에 두 번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선의 임금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 나라의 대학자들, 사대부 중에 그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사서삼경을 함께 읽으면서 지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걸 했던 나라니까 우리는 조금만 훈련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발언권이 없었던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잣거리에서 탈만 하나 뒤집어쓰면 양반 흉도 봤고요, 나라님 흉도 봤어요. 그걸 얼마나 웃깁니까? 그냥 포졸들이 가서 “네 목소리 듣고 알았다. 네놈인 줄 알았어.” 끌고 가서 곤장 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저잣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았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토론의 대안, 숙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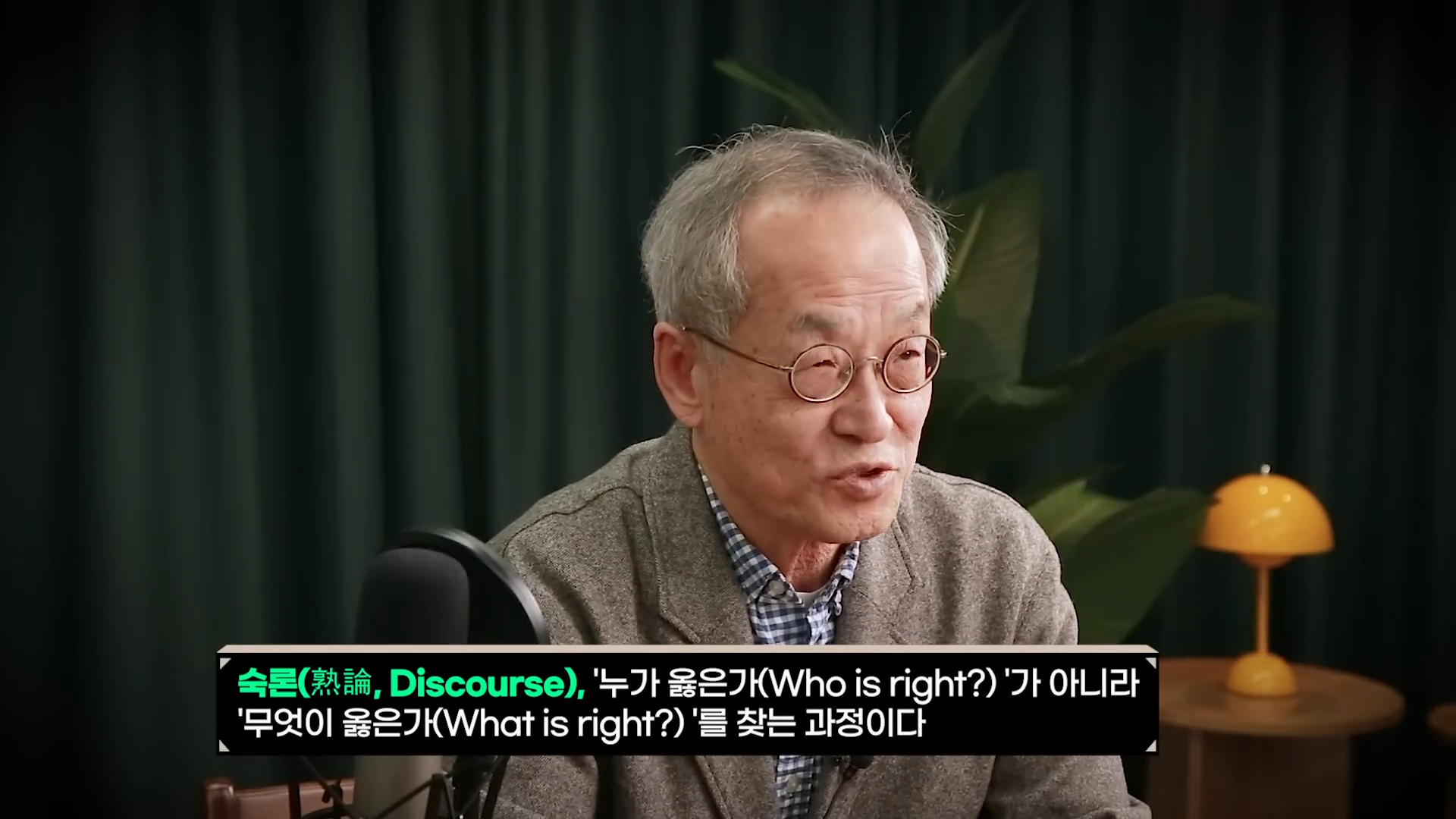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토론의 한자로 적었을 때 ‘討토’자가 치다, 정벌하다의 의미더라고요. 그의 토론 좀 하자. 서로 두들겨 패기만 하는가 싶어서 너무 오염된 토론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제가 숙론(discourse, 熟論)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숙’자가 저에게 숙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얘기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숙론을 할 수 있게 되면 통섭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 꽃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6~9세, 수학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 학습법 (1탄, 만6~7세) (0) | 2025.04.02 |
|---|---|
| 삐뽀삐뽀! 우리 아이 육아법 (0) | 2025.03.20 |
| 동화 속 ‘늑대’로 바라보는 인생 (0) | 2025.03.17 |
| 재혼, 서두르면 안되는 이유 (0) | 2025.03.12 |
| 진짜로 가져야 할 욕망과 욕심 (1) | 2025.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