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욱*방송대교수]

우리는 모두 동화를 읽으며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무엇인가요? 생각나는 캐릭터가 있습니까? 호박이 마차가 된다든지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화에는 일상, 평범한 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동화라고 하죠.
머리가 쉽게 지치는 요즘, 저는 동화를 다시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장면들, 어떤 사건들은 일상의 삶의 단면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또는 매우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단골 악역을 맡는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늑대라 하니까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째려보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그분이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모자와 ‘늑대’

여기에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삽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늑대가 보이고 또 소녀가 보입니다.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의 "빨간 망토" 또는 "빨간 모자"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둘 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시선 처리는 어때요? 어긋나 있지만 의식하고 있는 게 도드라지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의 굽은 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이 늑대의 굽은 자세와 그 뒤에 있는 눈길은 소녀의 어두운 운명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늑대 자신이 악한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굳혀갈 운명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인간 삶 어디에서나 가깝게 존재할 정도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인간에게 복종해서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든든한 친구가 되겠죠. 최고의 친구가 되고 더 승격화되면 수호신이 되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굉장한 위협을 느낄 것이고, 포식자로 느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의 화신으로까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샤를 페로의 이 동화는 늑대가 악당으로서의 면모를 굳히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이 어린 소녀가 심부름을 갑니다. 심부름을 가는 길에 늑대가 등장해서 이것저것 위태로운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벗어난 어린 소녀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이 할머니하고 소녀는 희생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는 다 살아나게 되지만, 페로의 동화에서는 둘 다 희생됩니다.
희생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를 둘러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서 이 사회 구성원의 교육의 문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늑대와 소녀 사이의 유명한 문답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팔이 왜 이렇게 커요?"
그러면 늑대가 대답하죠.
"너를 꼭 안아주려고 그러지."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커요?"
"너를 잘 보려고 그러지."
"할머니, 귀는 왜 이렇게 커요?"
"너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할머니, 이빨은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늑대가 대답합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소녀는 늑대가 이상한 것을, 즉 할머니가 이상한 것을 낱낱이 밝혀냅니다. 그런데 늑대가 그것을 에둘러 설명을 합니다. 소녀는 늑대의 이상함을 밝혀내기는 하지만 그걸 종합해서 늑대임를 깨우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의 이상한 걸 찾아낼 때마다 늑대가 달콤한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의심을 통해서 그 늑대의 본모습을 밝혀낼 수 있을 지점들을 자기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소녀가 질문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은 늑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늑대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면 마지막 질문을 기다립니다. 언제 소녀가 “할머니 이빨이 왜 이렇게 커요?” 이 질문을 할지 기다려요.
만약에 소녀가 영악해서 이 할머니(늑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질문의 과정을 깨닫고 되짚어 가기 시작할겁니다. 자기가 놓친 대목 들을 되짚어 가요. 늑대는 ‘왜 이빨 얘기 안하는 거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해체되고 사라지고 말지 모릅니다. 이렇게 늑대와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단서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속 '늑대'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가 처음에 정착된 것이 1840년대 제임스 핼리웰 필립스(James Halliwell-Phillipps)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셉 제이콥스(Joseph Jacobs)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왼쪽 위를 보시면 첫 번째 돼지가 짚으로 집을 지었다가 집이 훅 날아가고, 왼쪽 아래 그림은 늑대의 배가 불길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는 아마 알고 계시는 것하고 좀 다를 겁니다. 늑대가 두 마리 돼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해서 유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돼지를 잡아먹는데 실패합니다. 세 번째 돼지는 계략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늑대를 보시는 것처럼 솥에 떨어지게 해서 뚜껑을 닫아 버립니다.(가운데 그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끓여서 푹 고아서 그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의 그림을 또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벽난로 위에 두 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죽은 앞의 두 돼지가 되겠고, 밑에 솥 걸려 있고요. 발바닥을 보십시오. 밑에 뭐가 있어요? 늑대의 가죽이 있습니다. 늑대는 그야말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네, 이런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마리 돼지 사이의 유대보다는 낱낱의 돼지들의 행동 방식과 습성입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살벌한 적자생존의 원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늑대와 돼지들간의 종적인 차이를 지우고 나면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착취 현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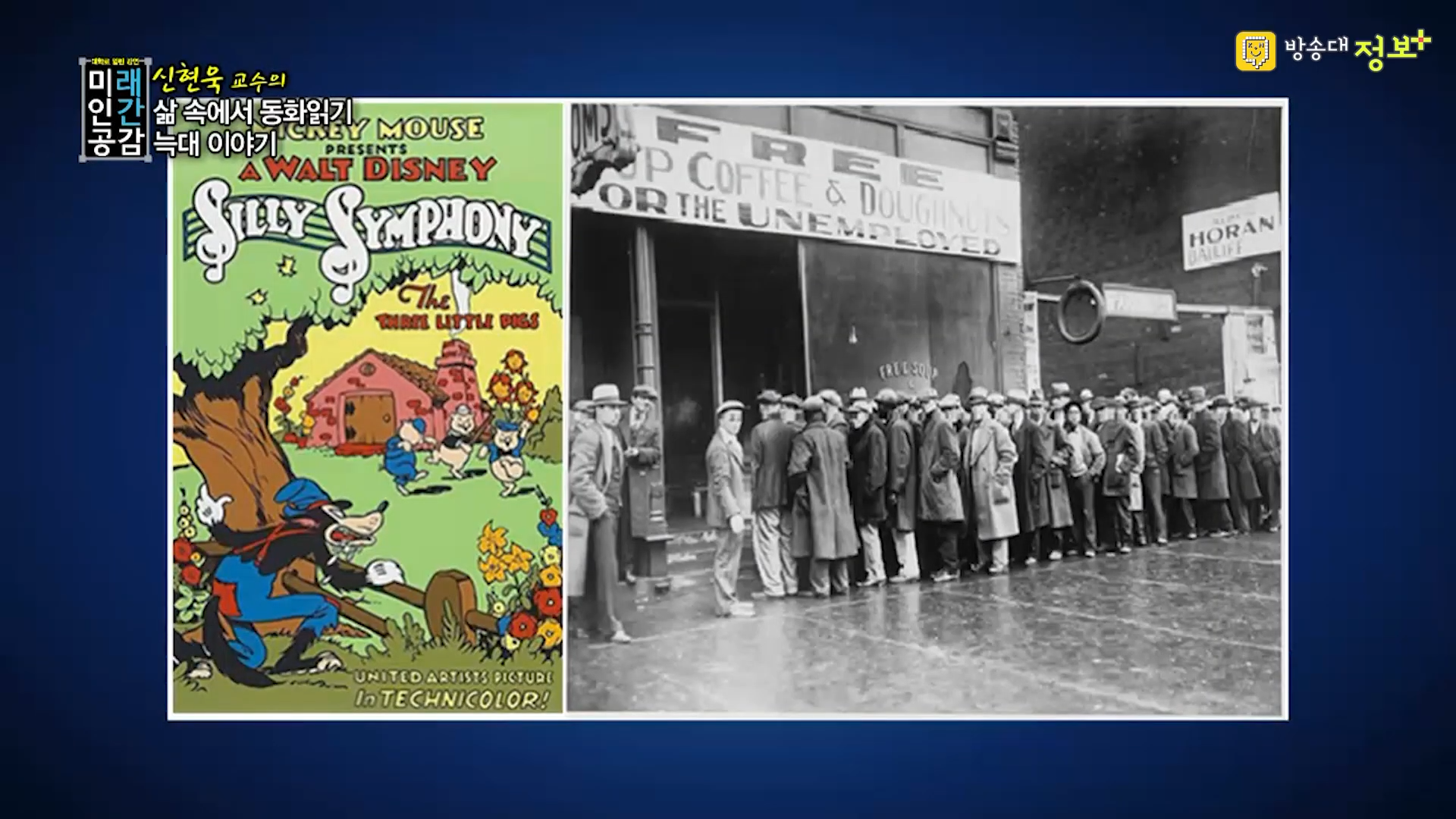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디즈니에서 만든 1933년 8분짜리 만화영화입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굉장히 큰 밥줄입니다.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공황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동화, 돼지 삼형제라고 하기 무색하게 다 낱낱이 따로따로 있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D사의 만화영화에서는 돼지 세 마리를 다 살려놓습니다. 세마리 돼지를 살리고 늑대 하고 맞세워 놓습니다. 돼지들 간의 유대나 연계를 설정을 해 놓은 셈이죠.
이 만화 영화는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대중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사진처럼 당대 삶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크게 환기시켰기 때문입니다.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에서 [집]은 안전한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집 밖을 나설 때에 닥치는 위험이 늑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돼지 삼형제>부터는 그 집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시켜 공간을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를 늑대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야기를 확장시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 늑대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한 가정의 규모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굉장히 포악한 커다란 늑대가 됩니다.

10년 뒤, 1943년도 W사에서 만든 거고, 약간의 패러디를 섞은 그런 만화영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돼지 두 마리가 첫째, 둘째입니다. 쫓겨온 돼지들입니다. 오른쪽의 문을 등지고 있는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지은 매우 실용적인 건실한 돼지입니다. 이 장면은 늑대가 불쌍한 행색을 하고서 밖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이 두 마리 돼지가 안으로 들여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돼지가 그러면 안된다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끌어들여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돼지들 간의 진정한 유대라는 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할 때에 도움을 주고 받는 자들 사이의 바른 인성 교육이 동반되지 않을 때 어떤 더 큰 어려움(늑대)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불러온 ‘늑대’라는 존재
우리가 늑대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늑대를 늑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초래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늑대를 내 쪽으로 돌려놓고 계속 그 늑대를 내 쪽으로 오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내가 화가 굉장히 날 때, 그럴 때 그것은 늑대가 '후~' 불었을 때에 집이 날아간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못 견디고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지. 사실 늑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동화를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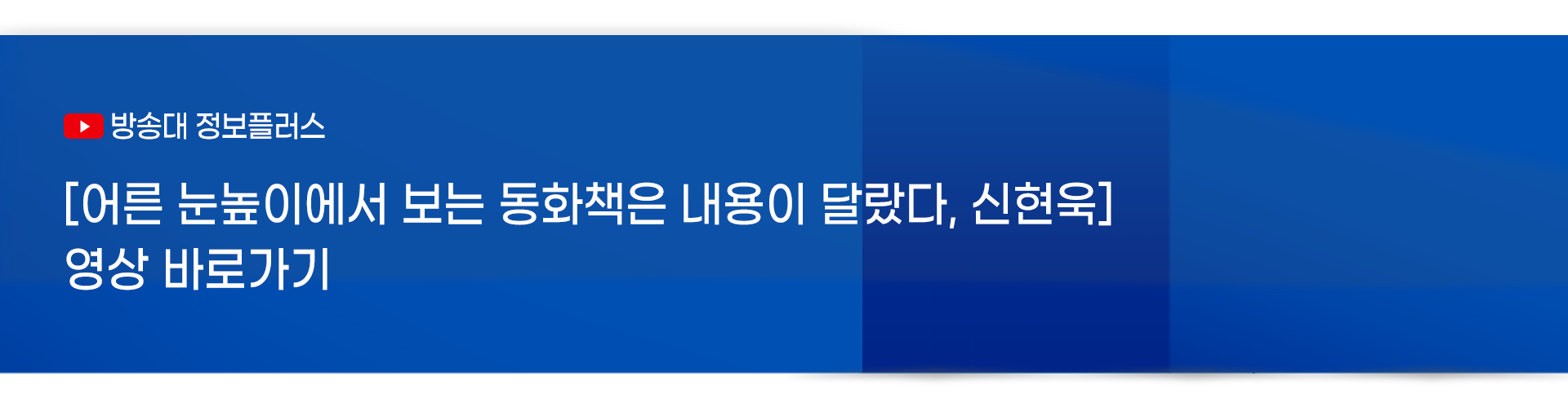
'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못 하는 1가지 (1) | 2025.03.26 |
|---|---|
| 삐뽀삐뽀! 우리 아이 육아법 (0) | 2025.03.20 |
| 재혼, 서두르면 안되는 이유 (0) | 2025.03.12 |
| 진짜로 가져야 할 욕망과 욕심 (1) | 2025.03.05 |
| 성적 상위 1%,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 (0) | 2025.02.26 |